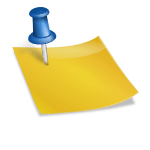195.[박성서 칼럼]’하숙생’ 가수 출신 정치인 1호 최희준의 삶과 노래 [3][박·송소코람]”하숙생”가수 출신의 정치가 제1호, 최·희준의 인생과 노래[3]1960년대를 직시하고 서민을 해학과 풍자로 달래 2020년 8월 7일 박·성서 ▲”길을 잃은 철새/옴 챠ー시하”앨범(신세기 노래-12809)과 전성기 시절의 가수 최·희준이.1960년대, 허스키 보이스로 등장하고 한국 가요계를 “미성 시대”부터 “개성 시대”로 전환시킨 주인공, 가수 최·희준(1936.5.30~2018.8.24).1961년”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을 시작으로 “하숙생”,”맨발의 청춘”,”팔도 강산”,”종점”,”징고게 신사”,”길을 잃은 철새”,” 뜨거운 침묵”,”광복 20년···등 수많은 히트 곡을 남겼다 60년대 최고의 가수이다.”가수 출신 정치인 제1호”란 수식어를 달고 화려하게 여의도까지 진출한 인물.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소박하고, 또 서민적인 캐릭터로 사랑을 받았다.90년대에 국회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의 지역구가 두개라고 항상 강조하기도 했지만”하나는 자신의 지역구인 안양 동안 갑구,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바로 가요계”이라고 말했을 만큼 가요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적이었다.한국 연예 협회의 가수 분과 위원장과 한국 문예 진흥원장도 역임하고 국민 문화 훈장의 화관장을 추서됐다.당시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재즈의 스윙 리듬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발표하고 끝없는 음악적 변신을 시도하는 대중 음악의 폭을 넓혔다.마음껏 자유로운 리듬 사이를 드나들던 가수, 최·희준의 인생과 노래, 그 3번째.그랄팍·성서(음악 평론가, 언론인)최·희준과 1960년대 드라마·영화 주제가 전성 시대, 멈추지 않는 질주의 전호에서 다루었듯, TBC방송 가요 대상으로 MBC10대 가수 상”꽃”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인기 가수상을 차례로 수상하는 동시에 펼쳐지는 최·희준 시절 요즘 히트한 그의 노래는 대부분 드라마, 영화 주제곡이었다.그렇게 최·희준의 전성기는 드라마와 영화 주제가의 전성 시대이기도 했다.문화 방송(MBC, 1961년)동아 방송(DBS, 1963년), 동양 방송(TBC, 1964년)등 라디오 방송국이 잇달아 만들어 다시 본격적인 텔레비전 시대가 열리면서 그것까지 서민의 오락이었다 편안히 극단 쇼가 점차 퇴조하기 시작했다.본격적인 “안방 극장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대중 가요의 판도가 점차 바뀌고 있었다.당시 드라마는 재방송까지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드라마 방송 시작 전과 후, 그리고 다시 방송 시작 전과 후. 언론과 해야 라디오가 거의 다던 시절에 이렇게 하루에 4차례 전파를 타서 노래가 히트하는 것도 당연했다.특히 이런 주제가는 1분 10~20초 이내에 첫을 처리해야 했다.이처럼 짧은 것도 큰 이점이었다.▲ KBS라디오 인기 연속극”하숙생”영화 포스터와 주제가 앨범(신세기 노래-12105).전호에서 소개한 것처럼 1964년, 시각 장애자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징고게 신사(MBC)”, 60년대의 뒷골목의 청춘들의 사랑과 고뇌를 그린 영화”맨발의 청춘(1964년 김·기독 감독)”, 60년대 생활상을 그린 서민 드라마”월급 봉투(MBC, 1965년)”사형수의 이야기를 그린” 뜨거운 침묵(KBS, 1965년)”젊은이들의 꿈과 야망을 그린”가슴을 폈다”(라디오 서울 1965년)에 이어”하…스쿠·존(MBC)”(1966년생)”(MBC)1967년)”등에 이어그의 히트 곡들의 행진은 거침없는 것이었다.당시 연속 드라마는 사회상을 그린 드라마와 함께 계몽적인 내용이 주류였다.그러므로 가사 중에 사회상과 세태, 시대상을 생생히 담고 있다.국민의 눈과 귀을 사로잡은 주제가를 계속 보고 보자.인생을 하숙생에 비유한 드라마”하숙생”우리 인생을 하숙생에 빗대어 표현한 최·희준의 대표 곡으로 KBS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된 드라마 주제가이다.방송 시작과 함께 대중의 입에 올랐고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미 히트한 노래이다.1965년 말 전라남도 여수의 한 공연장에서 팬들에게 “하숙생”을 부르고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그 순간, 최·희준 씨는 당황했다.가사를 아직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무척 당황한 그는 우선 관객에게 사과하고 그 날 저녁에 방송되는 드라마를 통해서 급히 가사를 익힌 뒤 그날 밤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특히 이 노래는 부를 때마다 앙코르 요청이 쇄도하자 처음부터 공연의 마지막 순서로 결정했다.드라마가 시작된 지 5일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그렇게”하숙생”은 처음부터 분신처럼 그를 따라다녔다.그리고 이”최·희준=하숙생”이라는 등식은 지금도 계속된다.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구름이 흐르게 감돌고 가는 길에/세이이치와 두지 않도록 미련을 갖지 않도록/인생은 나그네 도운이 흐르듯/기약 없이 흘러간다.인생은 알몸/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강의 물 흐르듯 희미해지는 길/날로 두지 말아 주는/인생은 알몸의 강물이 흐르도록/소리 없이 흐른다.-“하숙생”(김 주석아 작사, 김호 귈 작곡, 최·희준의 노래)드라마는 시작과 끝 부분에 방송되는 주제가 외, 극중에서도 수시로 나왔다.주인공이 변심한 애인의 집 앞에서 매일이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설정이었기 때문이다.드라마의 내용은 이렇다.주인공이 얼굴에 화상을 하면 연인이 배신,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주인공은 그 뒤 성형 수술을 한 뒤 복수 때문에 바로 옆집에 하숙하고 아코디언의 멜로디로 그녀를 괴롭힌다.이들의 연인에겐 추억의 멜로디였다.그녀는 마침내 후회하고 돌아오지만 주인공은 사랑도 미움도 모두 버리고 미련 없이 떠난다는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숙생에 비유했다.이듬해 정·지누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고 신·선일 김·조개가 주연을 맡았다.1970년 제16회 자카르타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 상(김·조개)을 수상하고 제27회 베네치아 영화제에도 출품했다.현재 충청 남도 천안 삼거리 공원에 이 노래의 노래비가 세워졌다.인근의 천안시 입장면이 극작가 김·솟크야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다.공처가의 애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