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우리는 국내 최초의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네온샛(NEONSAT) 1호’를 지구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민간기업인 쎄트렉아이(Satrec Initiative)가 공동 연구 개발한 ‘네온샛 1호’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027년까지 11개의 ‘위성 군집 운영’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런 계획을 반영하듯 1호기 발사의 임무명은 ‘군집의 시작(Beginning Of The Swarm, BTS)’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현재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인 ‘네온 세트 1호’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기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소형 군집위성’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4월 24일, 우리는 국내 최초의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네온샛(NEONSAT) 1호’를 지구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민간기업인 쎄트렉아이(Satrec Initiative)가 공동 연구 개발한 ‘네온샛 1호’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027년까지 11개의 ‘위성 군집 운영’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런 계획을 반영하듯 1호기 발사의 임무명은 ‘군집의 시작(Beginning Of The Swarm, BTS)’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현재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인 ‘네온 세트 1호’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기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소형 군집위성’이란 무엇일까요?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직전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참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직전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참조
이론적으로는 높은 궤도에 위치할수록 더 많은 신호를 포착하거나 관측할 수 있어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지구가 자전함에서 하나의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하다) 유리해 보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궤도 이상에 위치한 인공위성은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합돼야 하고 안정성과 내구도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무게도 500kg 이상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거운 무게의 위성을 높은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발사체의 추력도 만만치 않은 요구입니다. 흔히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대륙간탄도탄(ICBM)의 일반적인 정점 고도는 1200km 정도입니다. 북한이 사거리 15000km 정도로 평가되는 ‘화성-17호’를 고각 발사했을 때 정점 고도가 6000km 정도였기 때문에 중궤도 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데 얼마나 큰 추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높은 궤도에 위치할수록 더 많은 신호를 포착하거나 관측할 수 있어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지구가 자전함에서 하나의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하다) 유리해 보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궤도 이상에 위치한 인공위성은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합돼야 하고 안정성과 내구도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무게도 500kg 이상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거운 무게의 위성을 높은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발사체의 추력도 만만치 않은 요구입니다. 흔히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대륙간탄도탄(ICBM)의 일반적인 정점 고도는 1200km 정도입니다. 북한이 사거리 15000km 정도로 평가되는 ‘화성-17호’를 고각 발사했을 때 정점 고도가 6000km 정도였기 때문에 중궤도 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데 얼마나 큰 추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조
무거운 위성과 이를 높이 올릴 만한 추력의 로켓 제작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중궤도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추력의 로켓을 제작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밀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민간이 쉽게 개발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군사적인 용도의 기술이 이용되어야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궤도 이상의 인공위성 발사의 대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많은 비용을 들여 비싼 곳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정답일까요? 가벼운 위성을 여러 개의 같은 높이의 저궤도에 올려놓으면 이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경우 24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100kg 내외의 위성을 저궤도(500km 내외)에 여러 대 올려놓으면 중궤도 이상으로 위성을 한 대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낮은 궤도의 약점이 완전히 커버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위성의 간격이 촘촘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전체적인 성능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인공위성을 여러 대 동시에 제작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위성 제작 비용과 발사체(발사체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이 대폭 절감되지 않을까요? 무거운 위성과 이를 높이 올릴 만한 추력의 로켓 제작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중궤도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추력의 로켓을 제작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밀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민간이 쉽게 개발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군사적인 용도의 기술이 이용되어야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궤도 이상의 인공위성 발사의 대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많은 비용을 들여 비싼 곳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정답일까요? 가벼운 위성을 여러 개의 같은 높이의 저궤도에 올려놓으면 이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경우 24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100kg 내외의 위성을 저궤도(500km 내외)에 여러 대 올려놓으면 중궤도 이상으로 위성을 한 대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낮은 궤도의 약점이 완전히 커버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위성의 간격이 촘촘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전체적인 성능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인공위성을 여러 대 동시에 제작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위성 제작 비용과 발사체(발사체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이 대폭 절감되지 않을까요?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조
바로 위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 ‘초소형 군집위성’입니다. 저궤도에 작은 위성들이 빼곡히 모여 있다고 해서 ‘군집’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입니다. ‘초소형 군집위성’의 경우 군사과학기술을 무리하게 획득하려 하지 않아도 민간 차원에서도 위성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하며, 발사체 개발이 어려울 경우 발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초소형 군집위성’은 민간 차원에서도 사업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 사업에 응용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위성 인터넷 접속망인 ‘스타링크’ 시스템입니다. ‘스타링크’ 역시 5,000대 이상의 ‘초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네온 세트 1호’의 성공은 우리도 초소형 군집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우주개발 능력 배양도 앞으로 가속도를 낼 수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협업을 할 경우 그 속도는 더 빠르고 수준은 더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실/저 구성: 안제노 박사> 바로 위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 ‘초소형 군집위성’입니다. 저궤도에 작은 위성들이 빼곡히 모여 있다고 해서 ‘군집’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입니다. ‘초소형 군집위성’의 경우 군사과학기술을 무리하게 획득하려 하지 않아도 민간 차원에서도 위성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하며, 발사체 개발이 어려울 경우 발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초소형 군집위성’은 민간 차원에서도 사업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 사업에 응용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위성 인터넷 접속망인 ‘스타링크’ 시스템입니다. ‘스타링크’ 역시 5,000대 이상의 ‘초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네온 세트 1호’의 성공은 우리도 초소형 군집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우주개발 능력 배양도 앞으로 가속도를 낼 수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협업을 할 경우 그 속도는 더 빠르고 수준은 더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실/저 구성 : 안제노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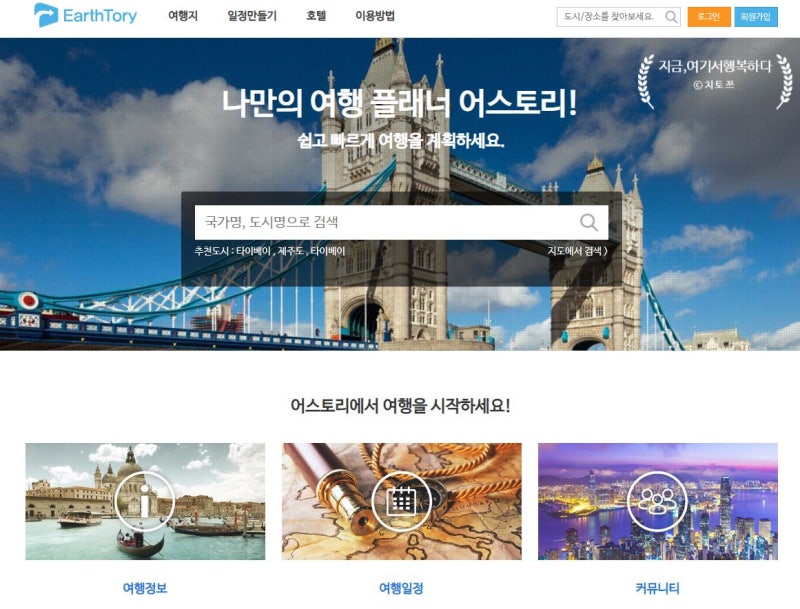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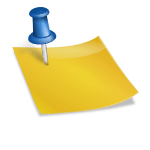
![[공지]브레인즈컴퍼니 2023 소프트웨어대전 참가(11/29~12/1) [공지]브레인즈컴퍼니 2023 소프트웨어대전 참가(11/29~12/1)](https://cdn.edujin.co.kr/news/photo/202207/39262_79422_811.jpg)